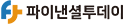국내 은행들이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비대면 등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최근 은행업권의 성장이 돋보인다. 이 같은 성장 이면에는 은행업을 이끄는 최고경영자(CEO)들의 활약이 뒷받침된다. 파이낸셜투데이는 각 은행마다 현 은행장들의 지나온 발자취와 임기 동안의 경영 실적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양수흥(85) 안양저축은행 대표는 1940년생으로, 저축은행 업계 최고령 CEO다. 2010년부터 15년째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올해는 이사회 의장에도 추대돼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안양저축은행은 경기도 안양시를 거점으로 삼고 1982년 10월 14일 설립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과 적금수입업무, 자금 대출업무, 어음 할인업무, 기타부대업무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55억원이다.
◆ 부동산 ‘법인’ 낀 지배구조…용역비 명목 승계 재원 마련
양 대표는 부동산 법인을 낀 지배구조 아래, 내부 특수 거래를 통해 용역비를 챙기고 배당 등으로 승계 재원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양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70.45%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 ‘성신’이다. 성신은 2016년 8월부터 안양저축은행 사옥을 관리하며 용역비로 연간 66~88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았고, 성신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양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연간 12~14억원의 용역비를 챙겨가고 있다.
또 양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은 성신을 제외한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주주는 ▲양정엽 22.51%(24만7669주) ▲양정한 7.04%(77만431주)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2021년 3월 양정한 씨 지분 2.61%(2만8719주)가 양정엽 씨한테 넘어가면서 재편됐다.
오너 소유 저축은행의 경우 세대가 교체되면서 저축은행 운영 의지가 저하됐을 때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많다. 저축은행은 신규인가가 불가능한 특수성 덕택에 인수·합병(M&A) 업계가 매물 가치에 주목해 온 산업군이지만, 금융당국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인수 확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고 매매 당시 제약도 크다.
경영 승계에 필요한 지분을 사전에 확보하고, 미리 배당을 챙기는 동시에 직접적인 지배구조상 노출은 피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지주 및 투자회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법인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지배구조는 M&A가 아닌 기업 간 지분거래를 통한 우회 인수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부동산 호황기 100억원 순익 돌파…PF發 업황 타격에 ‘반토막’
부동산 호황기를 이룬 2020~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돌파한 안양저축은행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타격이 이듬해(2023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순익이 ‘반토막’ 났다.
26일 안양저축은행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PF의 호황과 불황을 지나는 동안 당기순이익이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중반대 20~30억원 수준에서 50억원으로 순이익을 늘린 안양저축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0억원대 순익을 거두며 양적 성장을 이뤘다. 이후 부동산 호황기인 2020년 100억원 순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몸집을 불린 안양저축은행은 2021년 107억원의 최고점을 찍고, 2년 만에 50억원대 순익으로 쪼그라들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시화된 부동산 부실과 장기화된 시장 불황으로 수요가 대폭 급감하며 국내 대부분 저축은행이 마이너스 수익을 찍었던 시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부실여신)비율 및 연체율 평균은 각각 12.7%, 9.9%로, 2023년 말 대비 3.9%p(포인트), 2.5%p씩 상승했다.
이 중 안양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전년(8.9%, 9.8%)보다 각각 3.4%p, 3.2%p 늘어난 12.3%, 13%로, 업권 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부실여신 경·공매 유도로 상당수 부실채권이 정리됐지만, 부동산 경기와 실물경기의 장기 침체로 새롭게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 [뱅크리더탐구] 김학재의 귀환…안국저축銀, 154억 자본 확충해 반등 시도
- [뱅크리더탐구] 신승식 세람저축은행 대표, ‘25년 베테랑’의 내실 경영
- [뱅크리더탐구] 한소훈 삼정저축은행 대표,업황 부진 속 임기 첫해 순익 100억 ‘목전’
- [뱅크리더탐구] 이건선 부림저축은행 대표, 자산 늘렸지만…건전성은 악화
- [뱅크리더탐구] 김진백 모아저축은행 대표, 구원투수 역할 ‘기대 이하’
- [뱅크리더탐구] 이상명 남양저축은행 대표, 대를 이어 '나누는 삶' 실천하는 경영인
- [뱅크리더탐구] 이경희 금화저축은행 대표, 부동산PF 부실채권 털기 '부담 가중'
- [뱅크리더탐구] 양형근 민국저축은행 대표, 저성장 극복·M&A 성사 과제 '직면'
- [뱅크리더탐구] 노남열 키움예스저축은행 대표, 적자 탈출 소방수 나서
- [뱅크리더탐구] 전우석 조은저축은행 대표, 임기 내내 ‘흑자’…매각 성사 가능성은
- [뱅크리더탐구] 양동원 하나저축은행 대표, 임기 첫해 적자 탈출 과제 직면
- [뱅크리더탐구] ‘재무통’ 노용훈 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임기 첫해 분기 적자
- [뱅크리더탐구] 주성범 HB저축은행 대표, 흑자전환 '성공'…건전성 개선 '과제'
- [뱅크리더탐구] 류영학 더케이저축은행 대표, 적자 위기에 ‘소방수’ 역할 톡톡
- [뱅크리더탐구] 서혜자 KB저축은행 대표, 임기 첫해 ‘흑자’ 전환
- [뱅크리더탐구] 윤재인 DB저축은행 대표, 흑자 유지·재무건전성 개선
- [뱅크리더탐구] 장찬 OSB저축은행 대표, 임기 첫해 실적 리스크 떠안아
- [뱅크리더탐구] 이인섭 상상인플러스저축銀 대표, 임기 첫해 아쉬운 내부통제
- [뱅크리더탐구] 이재옥 상상인저축銀 대표, 발등의 불 '매각' 총력전
- [뱅크리더탐구]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대표, 10대 저축은행 입성 ‘주역’
- [뱅크리더탐구]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유동성 안정화·디지털 경쟁력↑
- [뱅크리더탐구]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 Top10 저축은행 안착 성공
- [뱅크리더탐구] 김정수 애큐온저축은행 대표, 디지털 혁신 주역
- 제2금융권 신용도 취약…지배구조·자본적정성 따라 등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