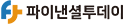6일 개봉

첫여름 / 31분 0초 / 온라인 시사회
로그라인 애인 학수정인기 분의 49재와 손녀 석윤이금주 분의 결혼식이 겹치고, 영순허진 분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리뷰》 날이 밝기 직전인 오전 7시경이다. 영화는 영순이 학수에게 전화 거는 통화 연결음으로 시작된다. 어스름한 빛인 여명이 비치는 이 시간에 영순은 창가에 몸을 기댄 채 오른팔로 턱을 괴고 있다. 눈가에 주름이 셀 수 없이 많고, 짙은 음영에도 불구하고 팔뚝은 여느 노인과 다름없이 피부가 버석하기 그지없다. 여러 잡티가 섬처럼 군데군데 있는데, 그러므로 그는 누가 봐도 70대 노인이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를 끊는 영순. 오전 7시 3분이다. 휴대폰 배경 화면에는 학수와의 오붓한 한때가 남아 있다. 영순은 다시 학수에게 전화를 걸고, 이내 불 꺼진 집에 들어가 홀로 춤을 춘다. / 금년 칸국제영화제 라시네프La Cinef 부문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1등상을 받은 ‘첫여름’은, 그 명성이 허성虛聲인지 진성眞成인지를 가늠하기 모호한 작품이다. ‘손녀의 결혼식 대신 남자 친구 49재에 가고 싶은 노년 여성’이라는 설정은 분명 매력적이다. 대중문화가 오랫동안 노년의 감정을 외면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허가영 감독은 ‘남친’과 연락이 닿지 않아 수면제를 먹고 잠든다는 외조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막상 영화는 주류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반복돼 온 ‘할머니도 여자다’ 내지 ‘노인에게도 욕망이 있다’는 명제를 다시 말할 뿐이고, 그 욕망이 억눌려 온 이유 또한 다소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우도 범한다. 라시네프는 전 세계 영화 학교 중·단편이 경쟁하는 부문. 이 작품은 완성된 감독의 완성된 영화가 아니라, 가능성 충만한 한 신인 감독의 첫 출발에 가깝다. / 얼굴에 팩 붙이고 피부 관리하는 할머니,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려 지리산 모텔에 간 “빽바지” 할아버지, 오늘 만나자는 문자에 하룻밤까지 보내는 노년 커플 등. 영화 속 노인들은 젊은이 못지않게 스스로를 가꾸고, 또 밤을 무서워한다. 그들의 밀어에는 세월에 풍화된 자조와 체념이 서려 있어 청춘의 원나잇과 비교해 격조도 자못 높다. / 하지만 영화는 영순과 딸 선이신미영 분의 대화 이래로 급속히 촌스러워진다. 하나뿐인 손녀 결혼식에 왜 못 오냐며 따지는 딸, 아빠와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다 보고 자랐는데 왜 이해 못 하냐는 엄마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엄마는 네 아빠랑 살 때 너무 무섭고 싫었다”는 말 다음으로 오는 특정 한마디가 문제다. 이제껏 쌓아 온 감정의 둑을 와르르 제 스스로 무너뜨린다. 또한 “그놈학수이 만져 주니까 동하더라”는 영순의 고백은, 여성의 욕망을 솔직히 풀어냈다는 해외 평단의 찬사가 실은 직설적 표현의 무비판적 수용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여성의 욕망은 그저 부드럽게 대해 주기만 하면 발현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데 말이다. 노년의 성을 꼭 억압과 해방의 기치 아래 가둬야 했을까. 게다가 영순은 딸을 향해 “넌 이혼도 해 봤다”며 힐난한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며 결국 영순은 ‘가부장제의 희생양’이라는 익숙한 틀에 꼼짝없이 갇히고 만다. / 배우가 곧 영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허진과 본작이 꼭 그렇다. 그의 존재는 영화 초반의 여명을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인 황혼으로 오인하게 할 만큼 인상적이다. 저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날 해치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시간. 1949년생 노인 허진은 그 경계에서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또 다른 노인을 연기한다. 콜라텍에서 선보이는 연기도 발군이다. 속옷 가게 사장에게 학수의 부고를 알리면서 펼치는, 도통 그 진의를 모르겠는 표정 변화가 대단하다. 웃었다가, 체념하고, 일순간 “난 저승 친구가 더 많다”며 호통친다. 화났다가도, 안도하는 어조로 “호강하며 가서 다행이지 뭐” 하며 명복도 빈다. /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KAFA 41기 졸업작인 이 30분짜리 단편은 군데군데 습작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허진과 정인기 외 배우들의 연기가 그런 아쉬움과 맞물린다. 배우의 연기는 감독의 지도로 더 나아질 수도, 그 정반대일 수도 있는 미완의 것이다. 모녀 갈등 이후로 영순의 감정선이 흐릿해지는 것도 아쉽다. 영순의 마지막 결정에는 서사를 종지부 찍을 만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 학수의 부재에도 불구, 여자의 삶은 하염없이 지속될 뿐이다. / 주인공의 자아 해방을 그리나, 그 계기가 하필 남자라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남는다. 설령 남편이 과거 폭력적이었고 지금은 똥 기저귀를 차고 산다 해도, 결혼한 여자가 버젓이 다른 남자도 만나는 설정은 자칫 여성향 판타지로 읽힐 수 있다. 20대 감독이 만든 70대 노년의 사랑 이야기인 탓인지, 노인도 청년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다소 강박적으로 강조하는 듯한 인상도 남긴다. 노년의 섹스를 다룬 작품은 이미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2002)가 있었다. 전인미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문제적’이라 부르는 것은 편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아울러 ‘칸이 인정했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칭찬을 덧대는 것은 사대주의와 다를 바 없다. / 허 감독은 경영학을 전공한 뒤 회사에 다니다 KAFA에 진학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상금 1만 5000유로한화 약 2400만원를 첫 장편 제작비로 쓸 계획이라 밝히며, 다작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고 소원했다. 본 영화는 티켓값 3000원에 메가박스에서 단독 상영된다. 평일 기준, 영순이 다니던 콜라텍 입장료보다 2000원 비싼 가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