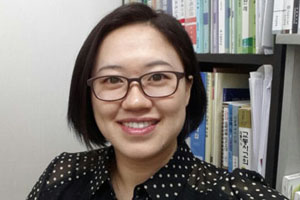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혼인건수는 약 30만5500건인데 반해 같은 해 이혼건수는 약 11만5500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약 10쌍의 부부 중 3.5쌍의 부부가 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2011년까지는 4년 이하의 혼인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2년부터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하는 제기하는 이혼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작성된 내용과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반소장 또는 답변서 등에 작성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술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근래에는 재혼한 부부의 이혼 소송도 적잖게 제기되는 추세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에 잦은 마찰과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위 사례의 부부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는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급기야 A는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아내인 B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에게 이혼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와 함께 거액의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만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데 반해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A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기간이나 B의 가출사실 등의 사정을 고려해 남편 A가 부인 B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억원 상당을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더라도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500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물론 부부가 파탄당시 처한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다른 금액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뿐입니다.
재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혼인기간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소지도 있지만 대부분 5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혼 이후 새로운 재산 증식에 대해 배우가의 기여 부분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전업주부로 가사생활만을 해온 아내에게 ‘몸만 왔다’는 표현으로 하면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하는 반면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희생한 것이 억울해서 재산의 절반 이상은 받아야겠다는 주장을 종종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전체에 대한 정산의 문제로 보통의 남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내의 기여도를 판단, 최소 40% 내지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절차는 아주 지루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지만 이 길고 힘든 절차를 상담하기 위한 분들이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그냥 돌아가실 때 오히려 제 마음이 가벼운 것은 이와 같은 절차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일 것 입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